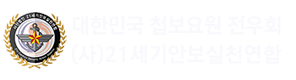공개게시판
 실미도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다.
실미도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다.
공작새
0
28
15:23

글쓴이, 김성호 전 의원 /특수임무자보상법률대표발의
실미도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다.
54주기 맞아 ‘실미도의거’, ‘군 인권의 날’로 제정해야
1. 실미도에는 아직도 붉은 피 비가 내린다.
지난 8월 23일(토)은 실미도사건이 일어난 지, 54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1971년 이날 실미도 섬에 갇혀 있던 공군 소속 실미도부대원 24명은 가혹한 학대와 국가의 약속 위반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로 진입했다 모두 사살되거나 사형당했다.
실미도사건은 시작부터 파국까지, 철저한 국가 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연속이었다.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가, 정작 자신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1968년 북한 김신조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사태가 일어나자, 당시 정부는 김일성 암살을 위해 김신조 부대원 숫자와 같은 31명으로 구성된 ‘남한판 김신조 31명 특공대’를 창설했다. 육군의 선갑도부대, 공군의 실미도부대, 해병대의 강화도 ‘까치부대’ 등 3개 부대다.
모두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 주둔한 특수부대였다. 육군의 선갑도부대는 모두 사형수나 무기수 등으로 구성된 범죄자 부대였고, 해병대는 현역 해병대원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이들과 달리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군의 실미도부대가 출범부터 특히 문제였다.
실미도부대는 모집부터 국가차원의 불법과 사기였다. 도시의 하층민과 시골의 젊은 농사꾼을 대상으로 6개월 훈련 뒤 공작임무가 끝나면 군과 경찰 특채, 교사 월급의 16배 이상 지급 등을 내세웠다.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다. 정식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모집이었다. 처음 31명으로 출발했으나 훈련 중 맞아 죽는 등 7명이 죽어, 실미도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24명만 살아 있었다.
약속한 6개월 뒤 제대는 깜깜 무소식이요, 구타와 학대의 연속이었다. 3년 4개월의 살아 있는 지옥이었다. 공군은 은밀히 이들 부대원 24명을 북한 공작 침투 작전으로 위장해 서해 바다에서 집단 학살하기로 비밀작전을 꾸미고 있었다.
이에 실미도부대원은 자유와 해방을 위해 54년 전 이날 실미도를 탈출했다. 실미도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1차로 ‘무장공비 침투’라고 뒤집어 씌었고, 북한군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자 2차로 ‘군 특수범 난동’으로 다시 속였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군의 ‘실미도부대’를 군 범죄자들로 구성된 육군의 ‘선갑도부대’로 둔갑시킨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1, 2차 가해는 바로 국가가 실미도사건 때부터 저질렀다. 국가가 실미도사건을 ‘군 특수범 난동’으로 2차 가해 하는 바람에, 지난 2006년 7월까지 실미도부대는 범죄자부대로 잘못 알려졌다. 2003년 12월 개봉한 영화 <실미도>에 부대원들이 국가보안법 등 범죄자 출신으로 잘못 그려진 이유다.
2. 실미도부대와 나
나는 국회의원 시절, 200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미도부대를 포함한 ‘북파공작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 뒤 4년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마침내 2004년 1월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븍파공작원 특별법(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 당시 실미도부대원 유가족과 수많은 북파공작원들을 만났다. 범죄자라는 한 때의 젊은 날의 실수로, 국가를 상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살아왔던 선갑도 부대원들도 직접 만났다. 국가의 형 감면과 사면 약속에 속은 선갑도 부대원들에 대해서도 뒤늦은 사면과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게 했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 <실미도>를 만들 때, 나를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북파공작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영화 제작에 적극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2003년 12월 영화 <실미도> 첫 시사회도 내가 국회에서 개최했다. 영화가 북파공작원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당연히 북파공작원 특별법 통과에 도움이 되었다.
나는 지금 실미도유족회 자문위원장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북파공작원) 고문을 맡고 있다. 아직도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미도부대 유가족을 만날 때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 의문이 떠오른다. 냉전 시대 남북은 모두 공작원을 파견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파공작원을 영웅 취급했고, 남한은 북파공작원을 개죽음으로 취급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3. 실미도사건은 ‘실미도의거’로 바뀌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진실이 드러나면, 역사적 사건은 제 얼굴과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한이 풀리듯, 이제 ‘실미도사건’은 ‘실미도의거’로 불러야 한다.
실미도사건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국가의 사기와 폭력, 1·2차 가해로 얼룩진 전형적 국가 폭력에 의한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이자 반인륜적 범죄였다. 국가폭력의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는 없다.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의 위기에서 실미도를 탈출한 실미도사건은 명백한 정당방위다. 민주주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국가폭력에 저항할 저항권이 있다. 우리 헌법의 불문율이다. 실미도사건은 바로 국민 저항권 행사였다.
실미도부대원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이며, 탈출과정에서 부대원들에 의해 살해된 기간원들도 피해자요, 역시 숨진 민간인도 피해자다.
실미도사건의 유일한 가해자는 국가이다. 국가는 이제라도 실미도부대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국가가 나서 실미도사건을 ‘실미도의거’라 부르고, 실미도의거가 일어난 8월 23일은 ‘군인권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
‘군인도 인간이다!’ 실미도의거와 군 인권의 날 제정으로, 군대 인권유린과 야만적 가혹 행위를 뿌리 뽑고 국가의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실미도의거가 일어난 ‘8월 23일’은 공교롭게도 ‘세계 노예제도 폐지의 날’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현대판 군 노예’였던 실미도부대원에 대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찾아오지 않았다.
실미도유족회 임충빈 대표와 언니 임일빈씨는 숨진 오빠 임성빈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자매는 오빠의 눈물이라 생각해 참았던 가슴의 한이 화산처럼 터진다. 국가가 이들 자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도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자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영혼이 되어 실미도 하늘 위를 떠돌다 오늘도 피 비로 내리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그 이름을 불러주자.
“실미도의거!”
*내가 쓴 <북파공작원의 진실>(2022년 10월)에는 소설 보다 더 기막힌 북파공작원들의 피눈물 이야기가 있다.
실미도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다.
54주기 맞아 ‘실미도의거’, ‘군 인권의 날’로 제정해야
1. 실미도에는 아직도 붉은 피 비가 내린다.
지난 8월 23일(토)은 실미도사건이 일어난 지, 54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1971년 이날 실미도 섬에 갇혀 있던 공군 소속 실미도부대원 24명은 가혹한 학대와 국가의 약속 위반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로 진입했다 모두 사살되거나 사형당했다.
실미도사건은 시작부터 파국까지, 철저한 국가 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연속이었다.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가, 정작 자신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1968년 북한 김신조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사태가 일어나자, 당시 정부는 김일성 암살을 위해 김신조 부대원 숫자와 같은 31명으로 구성된 ‘남한판 김신조 31명 특공대’를 창설했다. 육군의 선갑도부대, 공군의 실미도부대, 해병대의 강화도 ‘까치부대’ 등 3개 부대다.
모두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 주둔한 특수부대였다. 육군의 선갑도부대는 모두 사형수나 무기수 등으로 구성된 범죄자 부대였고, 해병대는 현역 해병대원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이들과 달리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군의 실미도부대가 출범부터 특히 문제였다.
실미도부대는 모집부터 국가차원의 불법과 사기였다. 도시의 하층민과 시골의 젊은 농사꾼을 대상으로 6개월 훈련 뒤 공작임무가 끝나면 군과 경찰 특채, 교사 월급의 16배 이상 지급 등을 내세웠다.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다. 정식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모집이었다. 처음 31명으로 출발했으나 훈련 중 맞아 죽는 등 7명이 죽어, 실미도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24명만 살아 있었다.
약속한 6개월 뒤 제대는 깜깜 무소식이요, 구타와 학대의 연속이었다. 3년 4개월의 살아 있는 지옥이었다. 공군은 은밀히 이들 부대원 24명을 북한 공작 침투 작전으로 위장해 서해 바다에서 집단 학살하기로 비밀작전을 꾸미고 있었다.
이에 실미도부대원은 자유와 해방을 위해 54년 전 이날 실미도를 탈출했다. 실미도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1차로 ‘무장공비 침투’라고 뒤집어 씌었고, 북한군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자 2차로 ‘군 특수범 난동’으로 다시 속였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군의 ‘실미도부대’를 군 범죄자들로 구성된 육군의 ‘선갑도부대’로 둔갑시킨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1, 2차 가해는 바로 국가가 실미도사건 때부터 저질렀다. 국가가 실미도사건을 ‘군 특수범 난동’으로 2차 가해 하는 바람에, 지난 2006년 7월까지 실미도부대는 범죄자부대로 잘못 알려졌다. 2003년 12월 개봉한 영화 <실미도>에 부대원들이 국가보안법 등 범죄자 출신으로 잘못 그려진 이유다.
2. 실미도부대와 나
나는 국회의원 시절, 200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미도부대를 포함한 ‘북파공작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 뒤 4년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마침내 2004년 1월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븍파공작원 특별법(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 당시 실미도부대원 유가족과 수많은 북파공작원들을 만났다. 범죄자라는 한 때의 젊은 날의 실수로, 국가를 상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살아왔던 선갑도 부대원들도 직접 만났다. 국가의 형 감면과 사면 약속에 속은 선갑도 부대원들에 대해서도 뒤늦은 사면과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게 했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 <실미도>를 만들 때, 나를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북파공작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영화 제작에 적극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2003년 12월 영화 <실미도> 첫 시사회도 내가 국회에서 개최했다. 영화가 북파공작원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당연히 북파공작원 특별법 통과에 도움이 되었다.
나는 지금 실미도유족회 자문위원장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북파공작원) 고문을 맡고 있다. 아직도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미도부대 유가족을 만날 때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 의문이 떠오른다. 냉전 시대 남북은 모두 공작원을 파견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파공작원을 영웅 취급했고, 남한은 북파공작원을 개죽음으로 취급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3. 실미도사건은 ‘실미도의거’로 바뀌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진실이 드러나면, 역사적 사건은 제 얼굴과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한이 풀리듯, 이제 ‘실미도사건’은 ‘실미도의거’로 불러야 한다.
실미도사건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국가의 사기와 폭력, 1·2차 가해로 얼룩진 전형적 국가 폭력에 의한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이자 반인륜적 범죄였다. 국가폭력의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는 없다.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의 위기에서 실미도를 탈출한 실미도사건은 명백한 정당방위다. 민주주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국가폭력에 저항할 저항권이 있다. 우리 헌법의 불문율이다. 실미도사건은 바로 국민 저항권 행사였다.
실미도부대원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이며, 탈출과정에서 부대원들에 의해 살해된 기간원들도 피해자요, 역시 숨진 민간인도 피해자다.
실미도사건의 유일한 가해자는 국가이다. 국가는 이제라도 실미도부대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국가가 나서 실미도사건을 ‘실미도의거’라 부르고, 실미도의거가 일어난 8월 23일은 ‘군인권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
‘군인도 인간이다!’ 실미도의거와 군 인권의 날 제정으로, 군대 인권유린과 야만적 가혹 행위를 뿌리 뽑고 국가의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실미도의거가 일어난 ‘8월 23일’은 공교롭게도 ‘세계 노예제도 폐지의 날’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현대판 군 노예’였던 실미도부대원에 대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찾아오지 않았다.
실미도유족회 임충빈 대표와 언니 임일빈씨는 숨진 오빠 임성빈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자매는 오빠의 눈물이라 생각해 참았던 가슴의 한이 화산처럼 터진다. 국가가 이들 자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도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자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영혼이 되어 실미도 하늘 위를 떠돌다 오늘도 피 비로 내리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그 이름을 불러주자.
“실미도의거!”
*내가 쓴 <북파공작원의 진실>(2022년 10월)에는 소설 보다 더 기막힌 북파공작원들의 피눈물 이야기가 있다.